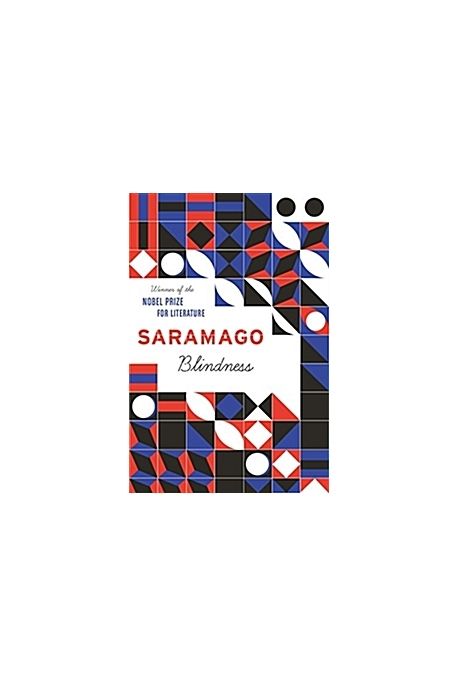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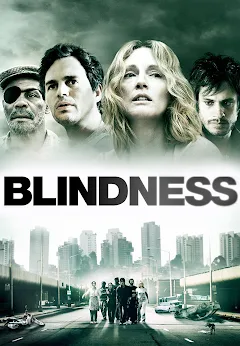
<눈먼 자들의 도시>(1995)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이다. 주제 사라마구(1922~2010)는 포루투갈에서 태어났다. 1947년 등단했지만 19년 동안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지 않았다. 추방된 후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수도원의 비망록><히카르두 헤이스가 죽은 해>로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쉼표와 마침표 외의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시나 나라 같은 고유 명사도 쓰지 않는다.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 (2008) 120분
감독: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1955년 생 브라질 감독이다. 2002년 <시티오브갓>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2019년 <두 교황>을 찍었다.
이 영화는 2008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줄거리
갑자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눈이 먼다. 최초 발화자는 일본인 남성. 그와 접촉한 사람들, 의사, 행인, 부인 등 모두 눈이 먼다. 전염병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자 정부는 눈먼 자들을 수용소에 가둬버린다. 가두는 속도에 비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결국 정부 관계자들도 눈이 먼다. 하지만 유일하게 접촉자 중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의사의 아내.
의사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자 아내는 그를 돕기 위해 함께 들어간다. 눈먼 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그녀의 책임감은 무겁다. 주변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을 싼다. 이러다가 병균을 옮길까 염려한 의사는 조를 나눠 청소하고 옷을 불태운다. 바깥 사람들은 그저 음식만 제공하고 수용소 내부 일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총을 들고 들어온 악당이 생기자 그는 음식 값으로 귀금속을 요구한다. 이에 순응하는 수용자들. 급기야 귀금속 마저 떨어지자 여자들을 요구한다. 그렇게 폭력으로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까지 일어난다. 이를 두 눈 뜨고 본 아내는 참을 수가 없어서 총을 든 악당을 처단한다. 그리고 한 여자가 수용소에 불을 지르자 모두 밖으로 뛰쳐나온다. 밖에서 감시하던 군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자 지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수용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각자 도생하는 도시를 본다. 아내는 함께 수용소에 있던 친한 사람 몇 명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인간다운 식사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인 남자는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아내는 시력을 잃는다.
감독은 뭘 말하고자 했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스페인 영화 <더 플랫폼>(2019)이 떠올랐다. 가더 가츠테루-우루샤 감독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1층부터 300층까지 나뉜 계급 공간에서 인간의 야만성과 연대를 엿볼 수 있다. <더 플랫폼>에서도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계급이 생기는 것은 음식 배식과 총 때문이다. 모두 앞이 안 보이지만 총을 소지한 집단은 이를 이용한다. 그리고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인간이 이들을 돕는다. 현실에서 시각장애 때문에 차별받던 인간이 수용소에서는 갑이 된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났다. 유일하게 보는 아내는 선지자, 깨달은 자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중생들. 아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상황에서 앞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고 특권이고 짐이다. 아내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 희생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력이 돌아오게 되자 눈이 멀게 되는 설정은 상징적이다. 어차피 모두 눈 뜬 상황에서는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할까?
연대하는 모습은 왜 안 보여줄까?
<더 플랫폼>(2019)에서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비록 그 연대가 힘에 의한 연대지만. 분명 수용소 내에서도 악당이 총을 휘둘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 불을 지른 것처럼 충분히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내가 있는 쪽 방은 아내가 위생관리를 하지만 다른 방들은 어떻게 관리했을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내는 눈이 보이는데 왜 여자들을 제물로 바칠 때 가만히 있었을까? 자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후반부에 모두 수용소를 탈출하고 아내가 지친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온 개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개들 중에서도 인간의 시체를 갉아먹는 개가 있는 반면, 아내에게 다가온 개처럼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간을 좋아하는 개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났지만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 영화는 기분이 좋을 때 보기를 권한다.



